[기고] 내년 지방선거,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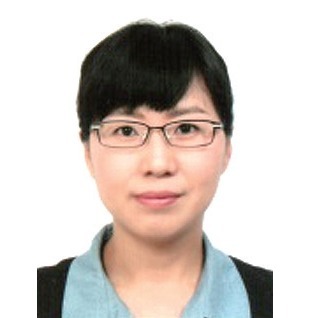
경기도는 장애인구나 장애인복지 인프라 규모와 비교하면 당사자의 정치참여도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일찌감치 설치됐거나 서울에서 떠밀려온 장애인복지시설들이 경기도에 주로 포진하기 시작하면서 시설 위주의 정책과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깨지기 어려운 모양새로 굳어졌다.
경기도는 재정과 지원근거 부족을 이유로 광역 장애인단체 적극지원을 힘겨워한다. 또한, 시군 장애인단체는 정치적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쉬워 별도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어렵다. 이는 길게 보았을 때 정책제시 역량의 약화로 이어진다. 양자는 모두 문제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탈시설지원법, CRP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장애인들이 얼마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다. 오래된 의문이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지역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은 법 집행 후의 혼란과 고충에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전 장애계 염원이었을 장애등급제 폐지만 해도 그렇다. 법 시행 후 행정 변화에 적응하고자 지역에서는 수차례 세미나와 학습을 반복해야 했는데, 폐지에 따른 혼란과 후유증은 지역장애인들이 오롯이 겪어내야 했다. 현재 제정 준비 중인 여러 법안도 법의 필요성과 지역 적용에서 더 나은 의견은 없는지에 대한 지역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하다. 이는 중앙 단체의 습관적인 지역 패싱(Passing)도 한몫을 했겠지만, 지역장애인계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데에 기인한다.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진출할 자리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장애인비례대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본다. 장애인당사자의 정보 공백과 소외를 막아줄 장치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고급정보 공유자로서의 비례대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령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비례대표, 시군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가공하는 비례대표, 지역 장애인당사자 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비례대표. 비례대표가 키(key)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포함해서 단 2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있다. 경기도 장애인구가 전국의 21%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 경기도 장애인의 권익과 정치력을 대변할만한 비례대표 수는 민망할 정도다. 각 당 경기도당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당선권 바깥 번호에만 장애인을 배정해 당사자로 하여금 희망고문을 겪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액세서리로서의 비례대표가 아닌, 직능대표 정치인으로서 장애인비례대표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가 궁금하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