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성큼, 아직도 프레임에 갇혀있는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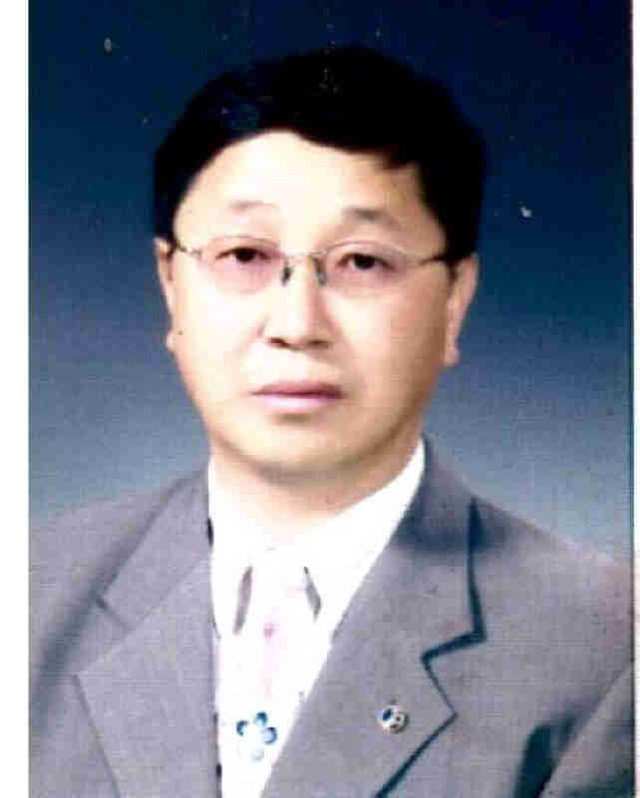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됐고, 그 후 경제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훈련 강화정책에 힘입어 직업훈련이 활발하게 진전돼 왔으며 조국 근대화의 기수임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직업훈련은 50년 역사와 더불어 최근까지 그래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훈련은 기존의 훈련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훈련(訓練)은 가역성이 있어 훈련을 중지하면 효과가 점점 소멸돼 제자리로 되돌아가기에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려면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 훈련해야만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구직을 위해 어떤 것을 가르치고 되풀이해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을 ‘직업훈련’이라고 했다.
과거의 1~3차 산업혁명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비교해 보자.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 19~20세기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으로 전기, 석유와 철강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혁신이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인 네트워크의 발달과 디지털 분야의 확장이 일어난 3차 산업혁명은 그 매체는 바뀌어도 이러한 매체를 다루는 주체가 사람, 즉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 프레임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과 사업의 확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매체의 틀은 3차 산업혁명과 같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돼도 그 주체가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크게 필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 문제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쟁점이 됐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필요한 융합형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직업훈련 프레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제는 과거 ‘훈련(訓鍊)’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단순기능과 반복된 숙련기술은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묻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기술혁신을 반영한 융합형 인력이 필요한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배제된 단순기능과 반복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체는 앞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융합 산업은 급변하며 발전 속도 또한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선도인력은 과거의 단순기능 및 반복훈련으로 양성 할 수 없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업훈련이 아닌 직업교육으로 용어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며 창의적이고 혁신기술이 접목된 융합형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중심 융합형 혁신기술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정부를 비롯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문계고등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등이 미래 직업교육에 대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잔잔한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 뒤에서 생성하고 있는 그 미래의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의 직업교육 기관들도 교육과정을 혁신 기술로 융합 개편하여 고등교육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직업교육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춘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