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윤창호 교수팀 "수면무호흡증 방치했다가 뇌 기능 떨어지고 뇌 조직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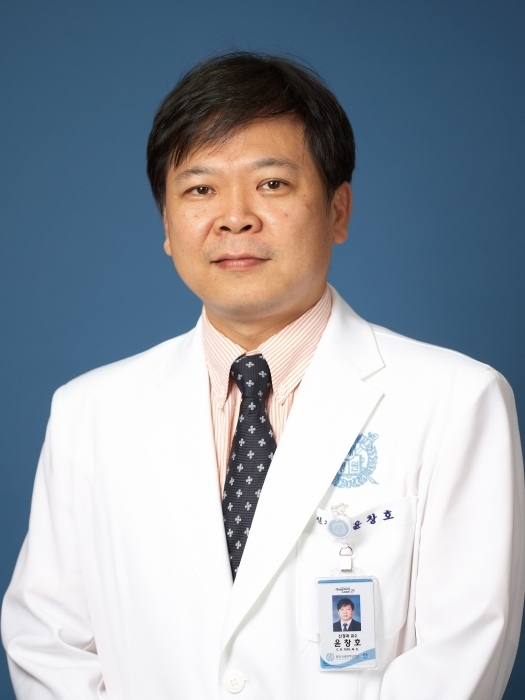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대뇌백질의 변성과 뇌 세포 사이의 연결까지 손상된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팀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이 증상이 없는 일반인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미국 수면연구학회 공식저널인 ‘SLEEP’을 통해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은 성인 인구 4~8%가 앓는 질환으로 수면 중 기도 막힘이나 호흡 조절의 어려움으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신체 내 산소공급이 중단되고 뇌가 수시로 깨는 수면분절을 초래해 주간졸음, 과수면증,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윤창호 교수팀은 수면무호흡증이 실제로 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수면무호흡증 환자 135명(평균 나이 59세)과 증상이 없는 건강한 대조군 165명(평균 나이 58세)을 대상으로 뇌 영상검사(MRI)를 실시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대뇌백질 변성(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백질은 주로 신경세포의 축삭이 지나가는 곳으로, 축삭은 우리 대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백질 변성이 생기거나 손상될 경우 뇌의 한쪽 부분에서 다른 쪽까지 정보 전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수면무호흡증 환자 뇌 영상에서 뇌 세포를 잇는 구조적 연결성(네트워크)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뇌 신경세포 연결 이상으로 구조적인 변화와 연결성에 이상이 나타나면 뇌 각 영역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보를 통합ㆍ분리하는 일에도 문제가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뇌 기능 저하가 일어난다.
윤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간헐적 저산소증,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잠자는 중간 중간 뇌가 깨는 수면분절은 뇌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결국은 각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적 연결성에도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리 뇌의 여러 영역에서 정보처리능력을 저하시키는 위험인자인 만큼 수면무호흡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 미시건대학 이민희 박사, 하버드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 연세대학교 한봉수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간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성남=문민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