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상생과 다양성이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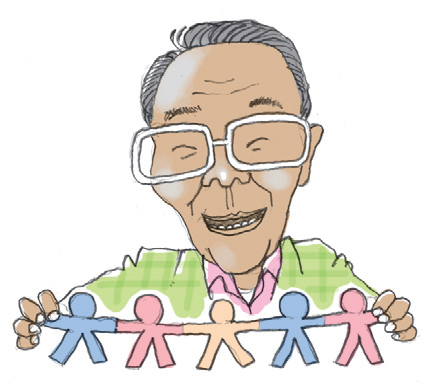
1980~1990년대 어린이들에게 ‘색종이 아저씨’로 큰 인기를 끌었던 분이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지친 기색 없이 열정적으로 종이접기 기술들을 선보였다.
예전의 ‘코딱지들’에게 ‘젊음은 도전’이라며 세상에 덤벼보라고 격려했다.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는 젊은 층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환호일색의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백수로 자라서 죄송해요ㅠㅠ”, “내일 이력서 내러 갑니다ㅠ” 우리 젊은 세대의 슬픈 자화상도 한 구석에 자리했다.
청년층 고용상황에 대한 경제 기관의 분석은 암울하다. 자동화 시스템 등 발전하는 생산기술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청년 취업의 틈이 더욱 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나름대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고 있느냐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같은 17개 대기업이 앞장서서 청년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이들 기업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해외에 두었던 공장을 국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고비용ㆍ비효율이란 부담을 감수하면서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 주겠다는 것이다. 이익만을 우선하는 ‘생존’ 보다는 ‘상생’으로 기업의 가치와 책임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도 중요한 청년 실업 해법의 요소다. 독일은 대학 졸업이 취업의 전제 조건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기부터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만 있다면 학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의 길이 열려 있다. 또한 직업의 성격을 사회적 신분의 척도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위치에서라도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면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 ‘대졸ㆍ대기업ㆍ정규직’만을 맹목적으로 좇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양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취업문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인식과 관점의 대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삶을 지탱하는 동력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함께해야 한다. 취업 장벽은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이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취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청년층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결코 건강한 국가를 추구 할 수 없다. 청년 실업 문제를 건강 지킴이가 고민하는 이유이다.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건강문화 디자이너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