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청와대와 국회 앞 뜰에 풍류산방 한 채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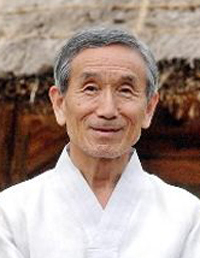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예외가 하나 있다. 일월영측(日月盈仄)의 자연의 철리를 거역하는 인간에 대한 조물주의 응징인지, 오직 하나 인간이 추락할 때만은 아름답지 않다. 아니 아름답기는 커녕, 추락(墜落)과 함께 더없이 추루(醜陋)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적 진실이다. 요즘 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눈대목 기사들은 바로 이 같은 경험칙을 증언하는 확실한 물증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청 포토 라인에 서는 추락하는 군상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추루하다. 높이 비상하며 잘 나가던 인사들의 추락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추루한 감정에 이어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원래 한 홉짜리 그릇에 불과해서 그런지 그 똑똑하다는 명사들이 그렇게도 간단한 사실을 한 가지 잊고 사는 바람에 그 같은 치욕을 겪다니 참으로 아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추락과 함께 추루해지는 권력자들
그들이 잊고 지낸 그 간단한 사실이란 무엇일까. 백인백색의 답이 있겠지만, 내 소견으로는 마음속에 음풍농월할 정자 하나 마련하는 여유 한 번 가져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겠다. 달이 떴는지 졌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른 채 주야장천 콱 막힌 그들만의 동굴 속에서 철부지의 선민의식만 즐기고 있었으니, 당연히 용행사장(用行舍藏)의 교훈이나 세상민심을 알 리 없고 초속 230㎞로 공전하는 지구촌 대자연의 섭리인들 알 리가 있겠는가.
자고로 권력병과 부귀병은 고황에 든 병인지라 화타의 의술로도 ‘토끼의 간’으로도 치유불능에 백약이 무효이다. 오직 하나 천기누설로 귀띰하건데 부귀공명병의 특효약은 오직 마음밭에 풍류산방 모옥(茅屋) 한 칸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거문고 한 대 걸어 두고 좋은 고전 읽어가며 마음밭 좀 가는 일이다.
선민의식 버리고 마음의 여유 가져야
옛날 저승사자에 끌려 세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불려 갔다. 명부를 대조하니 아직 죽을 때가 안된 사람들을 잘못 데려왔다. 염라대왕은 이들을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려보내며 소원 하나씩 풀어주기로 했다. 한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원해서 모두 들어주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소원은 달랐다. 고관대작이고 부귀영화는 모두 부질없으니 자기는 풍광 좋은 곳에 정자 하나 지어서 만권서적 쌓아두고 음풍농월하고 싶다고 했다. 염라대왕은 화를 벌컥 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바지만 나도 못하는 일이라고! 서울 지방에 전승되는 노래 삼설기(三說記)의 줄거리다.
아무튼 요즘 같아서는 국민의 성금으로 청와대나 국회 앞 뜰에 풍류산방 정자 하나 지어주고 싶은 심정이 솔직한 민초들의 속내일게다. 그래서 멋진 시조 한 수 편액으로 달아주고.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草廬) 한 칸 지어내니 반 칸은 청풍이요 반 칸은 명월이라/ 두어라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