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개인과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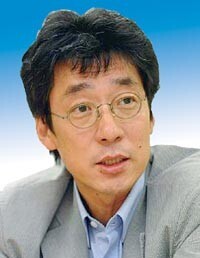
우리는 아마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사적 이해에 무게 중심을 놓게됨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함께 사는 가치의 실천과 행동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사적 이해와 공동체의 가치를 맞추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제 몸 하나 챙기며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지내는 범부들에게 공동체적 가치를 사적 이해에 앞세우길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에서 매순간 이항대립의 가치로 다가오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맺음을 규명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삶의 맥락을 규명하는 것과 같다.
개인과 공동체란 동서고금의 수많은 현인과 석학들이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던 열쇠 말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흔히들 동양은 공동체적 가치에 우선을 두는 반면 서양은 개인 자유 의지의 발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나, 그 사유의 진폭을 주의깊게 따라가다 보면 양자 모두 종국엔 개인과 공동체의 짝 맞춤을 위한 방편을 찾고자 함을 알게 된다.
그들의 성과를 빌어 말한다면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규범을 엮어내는 사회적 유기체라 할 수 있다. 거기서 개인의 규범이 자유 의지의 무한 확장에 있다면 공동체의 규범은 공동선의 극대화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맺음이란 자유 의지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유기적 운동성에 다름 아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인과 공동체
자유 의지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운동성에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맥락을 풀어내기 위한 몇몇 원칙은 규명될 수 있겠다.
첫째, 어느 누가 말했듯이 개인이 정당화될 수 없는 공동체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 의지는 공동선의 구현을 통해 확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공동선의 같음과 다름을 똑같이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란 개인의 자유 의지와 공동선을 규율하는 공동의 규범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칸트는 우리에게 인간 행위의 윤리적 규범으로써 “네 의지의 격률(格率)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가르쳐 주었다. 정언명령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맺음에 있어 실용적 영리함이 아닌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으로써 무조건적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화로운 관계 맺도록 노력해야
오늘 나의 자유 의지와 우리의 공동선은 어디쯤 와 있는가? 물론 이에 답변을 할 수 없다 해서 당장의 삶이 어찌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톱니바퀴에 물려있음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비록 당장의 삶이 바뀔 수 없을지언정 나의 자유 의지를 포기할 순 없다. 톱니바퀴 속에 갇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선마저 내려놓을 순 없다.
박명학 예술과마을 네트워크 상임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