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여백’과 ‘차마’의 문화로 돌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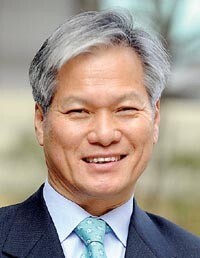
지난 60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발전한 것 같다. 특히 매번 선거를 치루면서 ‘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면이 있었다. 정치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말 끝장난 것이나 끝장날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작은 폭력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독재에 항거해 투쟁하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평화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나 과격한 시가 집회가 있기는 해도 70년대나 80년대 독재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견줄 수 없고 또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억압된 언로(言路)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정치인의 과격한 말이나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동원하여 다양한 이유로 증폭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불안한 심리를 만들고 있다. 이제 말은 검증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회자되기 때문에 말과 글의 무게가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말 안해도 상대배려 문화가 전통문화
이제는 말에 의한 공포를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현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말과 글은 일상에서나 인터넷에서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교류의 양과 속도가 늘어갈수록 말과 글의 절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설이 방송이나 공인의 공석에서 나오고 비속어가 강렬한 의미의 상징인듯 사용되고 또한 특정집단의 소외를 선동하거나 비하하는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말과 글이 형체 없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망각하여 가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문화를 압축된 단어로 표현할 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여백’과 ‘염치’ 그리고 ‘반의’일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바로 우리 전통문화인 것이다. 여백은 우리의 전통미술 속에서 잘 살아오고 있었고 지금도 이우환 같은 화백은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
우리시대 전통문화 가치계승 필요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라고 부를 때 우리는 친근감이 들지 악하다는 느낌을 갖지는 않는다. 욕쟁이의 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배려와 사랑의 의미를 갖는다. 염치는 차마할 수 없어서 행동과 말의 여백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전통사회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왜 이리 말이 험해지는 사회가 됐을까? 오랫동안 재갈을 물고 있다가 보니 이제 한껏 성깔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회적인 경쟁이 심해져서 불안한 심리를 배출하는 카타르시스로서 험한 말을 뱉어 내는 것인지? 하여간에 험한 말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방어하게 만든다. 이제 행복한 우리 미래를 위해 진정 전통문화의 가치계승이 절실한 시대가 됐다.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위원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