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풀뿌리 협동조합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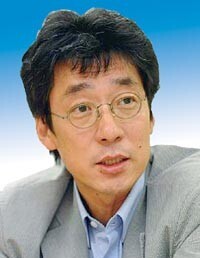
올 해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고 한다. 이에 부응하듯 우리나라 역시 작년 연말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한 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공표했다.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관계로 실제 법령의 시행일이 2012년 12월 1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5인 이상의 모임만으로도 소정의 여건을 갖출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문호가 한층 개방되었다. 아직 우리 주변에서 이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그리 넓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법령의 일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공동체적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적 결사체의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구의 경우, 이미 19세기 중반 협동 경제학에 바탕을 둔 로치데일 원칙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들어 자발성과 개방성, 민주성,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연대의 정신,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원칙이 자리 잡기까지 협동조합의 가치체계를 정립하려는 지속적인 모색이 이어져왔다. 물론 우리에게도 향약, 두레, 품앗이, 계 등 공동체에 기반을 둔 협동의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등과 같이 서로 조응하는 훌륭한 덕목이 자리 잡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오늘날 그 의미가 변질되고 퇴색된 부분이 적지 않다 하겠으나, 예부터 함께하는 가치 속에서 삶의 기반을 좀 더 깊고 넓게 다지려 했음은 양의 동서가 따로 있지 않았다.
‘자조의 공동체’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가치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협동조합이란 자급과 자립, 자활을 지향하는 ‘자조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자조의 공동체에선 스스로를 돕는 것과 서로를 돕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승수효과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거기선 조직과 자본력 등 규모의 크고 작음보단 가치 공유의 폭과 깊이가 어떠한지가 더욱 관건이 된다.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가치 공유의 폭은 협소해지고 그 깊이 역시 얕아질 수밖에는 없음을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려낼 협동조합의 모습은 가치 공유의 뿌리가 굵고 깊게 자리 잡힐 수 있는 지점에서 시작됨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곧 풀뿌리 공동체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들어나게 될 것이다.
수평적 협동·연대 이뤄져야
풀뿌리 협동조합이란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결사체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써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성(Community)이 결합된 좀 더 낮은 단계에서의 수평적 협동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결핍을 메우기 위한 협동, 경쟁과 배제가 아닌 상부상조와 연대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우리 사회 곳곳의 그늘진 자리에 협동과 연대의 기운이 퍼져나가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극복하는 사회연대의 공동체 모델로써 풀뿌리 협동조합의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박명학 예술과마을 네트워크 상임이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